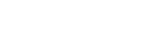암세포, 오염된 미토콘드리아로 면역계를 '독살'하다

암세포가 결함이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면역세포에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종양이 제거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토콘드리아가 단순히 세포나 동물 실험 모델에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몸에서도 이동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스탠퍼드대학교의 면역학자인 홀든 메이커(Holden Maecker)는 “처음엔 마치 과학 소설처럼 들렸지만, 연구진이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생물학적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현상의 빈도와 암세포에 어느 정도의 이점을 주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각 세포가 자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한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들은 미토콘드리아가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배양 접시에서 실험한 암세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로부터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빼앗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암 환자 몇 명의 미토콘드리아를 샘플링해 암세포와 암 조직에 침입한 림프구(TILs, Tumor-Infiltrating Lymphocytes) 내 미토콘드리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세 명의 암 환자에게서 암세포와 TILs 모두 동일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미토콘드리아를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암세포에서 건강한 면역세포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입증하고자 연구팀은 암세포에 형광 단백질로 표식한 미토콘드리아를 주입한 후 TILs과 함께 배양했다. 24시간 후 면역세포 내부에서 형광을 띠는 미토콘드리아가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15일 후에는 일부 면역세포에서 원래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완전히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세인트루이스)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이동을 연구하는 조너선 브레스토프(Jonathan Brestoff) 교수는 “이번 연구는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소유권’ 개념을 뒤흔드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암세포의 결함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받은 면역세포는 증식 능력이 감소하고 세포 자멸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우스 암 모델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받은 TILs이 암을 공격하는 능력을 상실한 ‘탈진된 T세포’(exhausted T cell)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일본 오카야마대학교의 폐과 전문의이자 암 면역학 연구자인 도가시 요스케(Togashi Yosuke) 교수는 “미토콘드리아 이동이 TILs의 탈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러 요인 중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보스턴의 면역세포 치료 연구 기업인 메디시 테라퓨틱스(Medici Therapeutics)의 최고 의료 책임자(CMO)인 니콜라스 레스티포(Nicholas Restifo) 박사는 암 연구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분야의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소규모 샘플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더 많은 환자 데이터를 확보해 이 현상의 빈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TIL 요법(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채취해 배양한 뒤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법)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주 소재 바이오기업 IMEL 바이오테라퓨틱스(IMEL Biotherapeutics)는 TIL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주입해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암 치료제 개발에서 미토콘드리아 이동을 차단하는 약물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서도 미토콘드리아 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브레스토프 박사는 “미토콘드리아 교환 현상이 암 외에 다른 건강 상태나 질환에서도 발생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doi.org/10.1038/d41586-025-0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