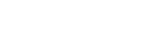‘잠든’ 암세포, 코로나와 독감으로 깨어날 수 있다

유방암 생존자 일부의 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잠복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종양 세포들이 숨어 있다가 어느 날 재발을 유도할 수도 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러한 이탈 암세포(rouge cells)가 COVID-19나 독감과 같은 흔한 호흡기 질환에 의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7월 30일자 Nature에 게재되었으며, 사람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천 명에 달하는 임상 데이터를 보면, SARS-CoV-2 감염은 암 관련 사망률을 거의 두 배로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었고, 이는 COVID-19 팬데믹 초기에 암 사망률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의과대학의 암생물학자인 제임스 디그레고리(James DeGregori)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단순히 암세포를 깨우는 데 그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기도 했다”며 상당히 극적인 결과라 말했다.
연구자들은 초기 종양에서 떨어져 나온 암세포가 유방암, 전립선암, 피부암 생존자의 골수 등 여러 조직에 숨어 있는 모습을 관찰해왔다. 이러한 세포들은 암이 먼 장기로 퍼지는 전이(metastasis)의 전조이며, 예를 들어 유방암 생존자의 약 4분의 1은 이런 세포들에 의해 재발과 전이를 겪을 수 있어, 여전히 문제가 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암세포가 어떻게 다시 깨어나는지를 오랫동안 규명하려 해왔다. 이전 연구들은 흡연이나 노화 등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디그레고리와 동료들은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급성 염증도 이러한 휴면 암세포를 재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유방암이 발생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생쥐 모델을 만들어 폐를 포함한 여러 조직에 휴면 종양세포를 퍼뜨리고 이후 생쥐에 SARS-CoV-2 또는 인플루엔자를 감염시켰다.
감염 후 며칠 만에, 폐에 있던 휴면 암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증식했고, 전이성 병변(metastatic lesions)을 형성했다. 하지만 연구진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병원체 자체 때문이 아니라, IL-6(Interleukin-6)이라는 핵심 면역 분자 때문이었다. (IL-6는 체내에서 외부 위협에 반응하는 면역 반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IL-6 유전자가 없는 생쥐를 만들어 실험했는데, 이 생쥐에서는 휴면 암세포의 증식 속도가 훨씬 느렸다.
연구진이 생쥐를 감염시킨 지 약 2주 후, 암세포들은 다시 휴면 상태로 돌아갔다. 디그레고리는 이는 감염이 암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지만, 감염 또는 유전자 돌연변이 등의 위협에 의해 암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이 과정을 불을 지폈다 다시 꺼뜨리는 것에 비유하며, “불꽃을 일으켰다가 다시 꺼지긴 했지만 이젠 이전보다 불씨가 100배나 많아진 셈”이라며 “이 불씨가 다시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 덧붙였다.
연구진은, IL-6가 암세포를 깨우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또 다른 핵심 면역 세포인 헬퍼 T세포(helper T cell)가 암세포를 다른 면역계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암세포가 면역계를 조작해 자기 자신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걸 보게 된 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디그레고리는 언급했다.
UK 바이오뱅크(UK Biobank)와 같은 대규모 인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도 쥐 실험 결과를 뒷받침했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서 암 관련 사망 위험이 증가한 현상은 감염 직후 몇 개월 동안 가장 두드러졌으며,이는 쥐에서 관찰된 재활성화된 암세포의 급격한 증식 시점과 유사하다.
이번 결과는 병원체에 의한 만성 염증이 겉보기엔 무관한 건강 문제들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흐름에 또 하나의 증거를 더한다. 예를 들어, 흔한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 감염은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 발병 위험을 높인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병원체에 의한 급성 염증과 암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한 첫 번째 사례라고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예일대학교 의대 면역학자 아키코 이와사키(Akiko Iwasaki)는 말했다.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홉킨스 의대 암생물학자 미칼라 에게블라드(Mikala Egeblad)는 이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암 생존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전략이나 지침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중증 COVID-19 환자에게 IL-6 억제제를 사용해 염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해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약물이 암 재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과학적 해답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디그레고리는 암 생존자들은 호흡기 감염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심하고, SARS-CoV-2나 독감 바이러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디그레고리와 동료들은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다른 암 종류, 폐 외 조직, 그리고 다른 흔한 병원체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doi.org/10.1038/d41586-025-02420-1